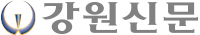원주우체국 서무팀장
내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빚고 깎고 애쓰지 않아도 컴퓨터가 그려주고 프린터가 찍어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다.
우체국도 택배회사도 빠르고 신속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익일 배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퀵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속도가 최우선이다.
나의 10살짜리 아들은 요즘 성장통에 시달리고 있다.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신체가 적응하면서 생기는 통증인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도 너무나 빠른 발전 속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성장통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한다. 하지만 그 빠른 톡이나 짧은 SNS로 내 속마음을 잘 표현하고 서로 서로 진심을 소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몇몇 공인들이 짧고 경솔한 SNS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톡으로만 소통하다보니 오해도 많고, 긴 대화나 토론에 서툴러지는 세상이 된 것 같다. 가족 간에도 직장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고 난리다.
빠름~빠름~빠름의 세상 속에서 느리게 가는 SNAIL MAIL(달팽이 편지)이 그리워진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던 빨간 우체통도 빠름의 시대 속에서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얼마 전 유명한 관광지에 갔다가 느린 우체통이라는 걸 보았다. 느린 우체통에 엽서를 넣어 보내면, 1년 후에 그 엽서가 수취인에게 배달이 되는 특별한 우체통이다.
나도 느린 우체통에 나에게 쓰는 엽서를 적어 넣었다. 내가 쓴 엽서는 1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나에게 전달 될 것이다. 한자 한자 내 필체로 내려 쓴 엽서, 그리고 우체통에 톡하고 떨어질 때 나에게 쓰는 편지인데도 설렘이 있었다. 빠름의 시대에서 오랜만에 맛보는 느낌이었다.
연예할 때 받은 편지나 어릴 때 엄마에게 썼던 반성문 등을 모아 둔 상자가 있다. 아주 가끔 열어볼 때가 있는데 왜 그리 쑥스럽고 웃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스마트폰의 TALK 시대에서는 10년 뒤 어떤 것을 열어볼 수 있을까? 빠른 것은 빠른 대로 두고 사람과 사람과는 조금 느린 달팽이 편지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생명력이 점점 퇴색해가는 빨간 우체통도 영영 사라지기 전에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스마트폰으로 보내준 사진, 메일은 아무리 폰트를 예쁘게 꾸미고 사진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도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의 따뜻함을 따라 올 수 있을까?
지금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마트폰의 톡보다는 우표가 붙여져 있는 편지를 써보면 어떨가 싶다.